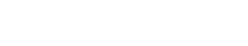- 배롱꽃 필 때의 추억
 |
아침저녁으로 서늘하고 배롱꽃이 한창 피어나는 이맘때의 추억 하나를 소환한다.
내 과거, 초등학교 5학년쯤으로 기억된다. 2km 남짓의 하교 길 중간에서 친구들과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귀가했는데 다음날 아침 도시락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이야 학교급식을 하고 있어 도시락이 필요 없는 세상이지만 1960년대 초반의 그때는 구리에 니켈과 아연을 합금한 네모난 양은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서 학교에 가지고 다녔었다.
지금에 와서 집밥이어서 좋았겠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매일 도시락 싸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도시락 메뉴는 대부분 보리밥에 김치반찬이었으며, 강냉이죽과 옥수수빵을 배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밥을 굶고 살지는 않았는데 도시락을 잃어버린 대가는 혹독했다.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은 당연했고 어머니도 그날은 도시락을 싸주지 않으셨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속이 쓰린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운동장 한켠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하염없이 맹물을 들이키며 배고픔의 쓰라림을 겪어야 했었다.
설움중에 배고픈 설움과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 추위를 막아주는 내 집의 따뜻한 구들방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바라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잡수셨습니까?" 하는 인사말은 얼마 전까지도 남아있었다. 그러니 도시락 잃어버렸다고 밥을 굶겼다는 그 말에 아내는 지금도 눈물을 글썽인다.
 |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안되었다. 전 해에 수확한 식량이 다 떨어지고 보리를 수확하는 초여름까지를 '춘궁기'라 하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 그 배고픔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쑥이나 풀뿌리, 소나무 속 껍질을 삶아 먹어야 했다. 그래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소나무 껍질의 '송기'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 변비로 인한 똥구멍 찢어지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난장판이 된 것을 '개판 오분 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큰 솥에다 밥을 지어 배식할 때 판자로 만든 솥뚜껑을 연다는 '개판 오분 전'을 외치면 밥 솥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난장판을 이룬대서 비롯된 말이란다.
1970년대 다수확 품종의 통일벼가 개발되고 다량재배하면서 식량난이 해결되었는데 그 전에는 밥 먹고 뛰기라도 하면 '배 꺼진다'고 혼내키던 시절이었다. 매년 여름 배롱꽃이 피고 지는 100일이 지나야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 그 보리밥이란 얼마나 감지덕지한 것이랴. 쌀 부족으로 나라에서 혼식과 분식을 권장했고 학교에서도 도시락 검사를 하여 보리나 잡곡이 섞이지 않았으면 혼이 났다. 그 시절 이런 가사의 혼,분식 노래까지 보급되었으니 지금에서야 살며시 미소 짓는 추억이 되었다.
꼬꼬댁 꼬꼬 먼동이 튼다/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앉아 꽁당 보리밥/꿀 보다 더 맛 좋은 꽁당 보리밥
꿀 보다 더 맛 좋은 꽁당 보리밥/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언택트의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들이 힘든 삶을 견뎌내고 있는 요즘, 백신개발의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해 본다.
이근섭 기자 rmstjq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