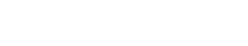- 발행인 칼럼
 |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한국의 선비들은 이름(名)외에 자(字)와 호(號) 등 보통 셋 이상의 호칭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성년이 된 사람의 이름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는 뜻에서 자와 호를 지어 부르도록 한 당시의 관습이었다. 자는 성인이 되는 관례(冠禮)때 부모나 스승이 지어주지만, 호는 스스로의 취향과 철학에 따라 마음껏 지을 수도 있고, 스승이나 지인들이 지어줄 수 있는 호칭이었다. 필자도 청년시절 한학을 공부할 당시 스승에게 후당(厚堂)이란 호를 받은 적이 있다. 자는 아랫사람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반면 호는 누구든 편하게 부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름보다 호가 유명해져서 호만 알고 이름을 잊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
조선 중기의 명필가 한석봉의 이름은 한호(韓濩)이다. 호를 ‘석봉(石峯)’이라 지은 것은 어려서 살던 개성의 석봉산에서 유래한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이육사(李陸史)의 이름은 이원록 또는 이활이다. 1927년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받은 수인(囚人)번호가 264번이었다. 당시 교도관들이 ‘이육사’하고 불렀는데, 그 소리(音)만 취해 자신의 호를 ‘대륙을 품은 역사’라는 뜻을 담아 ‘육사(陸史)’라고 했다. 이처럼 한호는 한석봉으로, 이원록은 이육사로 더 알려져 있다.
간송 전형필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맞서 민족의 얼과 혼을 지키기 위해 재산과 삶을 나라에 몽땅 다 바친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신’이다. ‘간송(澗松)’이란 호는 평생의 스승 오세창이 지어준다. 위창 오세창이 누구던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자 서화(書畵) 대수장가인 역매 오경석의 아들로 3·1만세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다. 당대 최고의 감식안으로 평가 받던 오세창은 스물을 갓 넘긴 전형필이 민족을 상징하는 흰 두루마리를 입고 찾아 온 것을 본 순간, ‘깊은 산속에 흐르는 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골물 간(澗)자를, 그리고 논어에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知松栢之後彫)’는 글에서 소나무 송(松)자를 취해 ‘간송’이란 호를 지어주었다고 한다. 간송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갑부였지만,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민족의 혼을 지키는 일로 아호 값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옹기(甕器)’라는 독특한 호를 가지고 있다. 김추기경의 조부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했고, 부모도 독실한 신자였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산중으로 숨어든 신자들은 대부분 옹기나 숯을 구워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옹기는 신앙심의 상징물이자 조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호인 셈이다.
흥미로운 일화를 가진 호도 많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로 삼재(三齋)와 삼원(三園)이 있다. 삼재는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관아재 조영석(또는 공재 윤두서)을 말하고, 삼원은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을 말한다.
자유로운 예술 혼, 순수한 예술적 정열을 가진 장승업은 술을 즐겨 취명거사(醉暝居士)로 불리며, 천재와 광인(狂人)의 사이를 넘나들던 화가였다.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로 추앙받던 김홍도와 신윤복을 가리키며 자신도 그들 못지않은 천재라고 자부했던 장승업은 단원과 혜원을 향해 ‘너희들만 원(園)이냐! 나도 원(園)이다!’라며 자신의 호를 오원(吾園)이라 했다.
여말삼은(麗末三隱)으로 불리는 목은(牧隱) 이색과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가 있다. 포은과 야은은 스승의 호에서 은일(隱逸)의 뜻을 취해 작호(作號)한 경우이다.
<승무>와 <지조론>으로 유명한 조지훈의 이름은 조동탁. 원래 그의 호는 ‘상서로운 풀이 자라는 비탈길’이란 뜻의 ‘지타(芝陀)’였다. 언젠가 모여고에 선생으로 부임해 여학생들에게 호가 ‘지타’라고 말하자 학생들이 얼굴을 붉혀댔다. 곰곰이 생각하다 조(趙)라는 성과 합해보니, ‘조지타’라는 이상한 발음으로 연상되었다. 결국 순수한 뜻을 살려 ‘지초의 향기’라는 ‘지훈(芝薰)’으로 호를 고쳤다고 한다.
조선 후기 화가인 호생관 최북(崔北)은 자신의 이름인 북(北)자를 반으로 쪼개서 자를 칠칠(七七)로 지었고, 붓(毫) 하나로 먹고 산다(生)고 하여, 호를 호생관(毫生館)이라고 지었다. 세도께나 있는 자가 자기를 업신여기며 그림을 그려달라고 협박하자, 화가 난 최북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면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저항을 했다. 애꾸눈에 붓 하나로 먹고 살던 칠칠(七七)은 49세 때 엄동설한에 홑적삼 바람으로 눈구덩에 빠져 얼어 죽은 기인이었다.
세조 때의 권신 한명회는 성종 15년, 한강변에 압구정(狎鷗亭)이란 정자를 짓고 ‘압구(狎鷗)’를 호로 삼았다. ‘갈매기가 노닌다’는 뜻의 정자 이름은 명나라의 문객 예겸이 지어준 것. 세상만사를 모두 접고 갈매기와 벗 삼아 유유자적하고자 했던 한명회의 압구정에는 날마다 벼슬을 탐하는 무리들로 흥청거렸다. 한명회는 압구정에 ‘젊어서는 사직을 위해 몸을 바쳤고, 늙어서는 강변에 누워 세상을 바라보네(靑春扶社稷, 白首臥江湖)’라는 글귀를 걸었다. 이를 본 매월당 김시습은 ‘젊어서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고, 늙어서는 강물을 더럽힌다.(靑春危社稷, 白首汚江湖)’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구 선생의 호 ‘백범(白凡)’은 1913년 일제치하 옥중에서 스스로 지은 호이다. 백범이란 백정(白丁)에서부터 범부(凡夫)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독립이 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의 호 ‘단재(丹齋)’는 일편단심 충절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정몽주의 단심가에서 유래한다. 독립운동을 하다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단재는 평소 일제치하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며, 온 몸이 다 젖을망정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선 채로 세수를 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의 호 ‘백야(白冶)’는 백의민족이 심신을 단련해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야(冶)’자는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려 강철을 만들 듯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야 함을 뜻한다.
한·일 관계 등 국제관계가 심상치 않은 요즘, 정치도 정치인도 없고 정치꾼들만 작당해서 이전투구를 일삼는다. 그들에게는 민족과 나라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 오직 진영논리만 있는 것일까. 친일 발언은 도를 넘은 지 오래고, 케케묵은 색깔 시비와 지역감정 선동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현들에게 부끄럽기만 하다.
사람의 호를 보면 그가 살아온 삶의 행적과 신념뿐 아니라, 사상과 철학을 잘 알 수 있다. 옛 사람들의 호 속에 담겨있는 뜻을 깊이 음미해보는 것도 가을에 줍는 토실한 이삭, 낙수(落穗)가 아닐까 싶다.
[대동문화 114호, 조상열 발행인 칼럼]
성슬기 기자 tmf59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