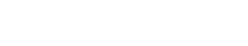|
|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
삼복의 폭염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서늘한 그늘 아래서 책을 벗 삼고, 좋은 벗님 내 들과 주거니 받거니 수작을 하다 보면 오만가지 시름이 사라진다. 인간이 번뇌가 많은 까닭은 기억력 때문이라니, ‘술에 취해 살고 꿈결에 죽는다.’는 취생몽사(醉生夢死)도 양생의 한 방법이요, 한여름 밤의 낭만이 아닐까.
주선(酒仙)으로 불리는 이백은 170여 편의 술시를 남겼고, 시선(詩仙) 두보 또한 300여 수의 술시를 지었다. 술은 묵객(墨客)들의 삶의 열정과 초탈의 묘약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이백이 얼마나 술에 빠져 살았는지는 두보가 이백에 대해 쓴 글을 보면 짐작이 간다.
이백은 술 한 말에 백 편의 시를 쓰고/ 장안 저잣거리 술집에서 잠들기 일쑤며
천자가 불러도 술에 취해 배에 오르지 못하니 / 스스로 일컫기를 술 신선이라 했다네.
(李白一斗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 自稱臣是酒中仙)
황제가 호출을 해도 만취한 몸을 가눌 수 없어 응하지 못했다는 이백의 삶이 한편 부럽기도 하다.
중국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술(酒)과 차(茶), 그리고 시(詩)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차가 이성과 현실을 담아낸다면 술은 정열과 초월, 시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낸다고 여긴 것이다.
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라 해도 무방하다. 인간의 기쁨과 슬픔,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음식이다. 오죽하면 살아서 못다 마신 술에 한이라도 맺힌 듯, 사후 제상에 술을 올려 귀신을 불러낼 정도이니 말이다.
술의 기원은 4천 년 전, 하나라 우왕 때 의적(儀狄)이란 사람이 술을 만들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임금이 술을 달게 마신 후 “뒷날 술로써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고 하며 술을 금지했다고도 한다.
술이란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술은 만병의 원인’이요, ‘백약의 으뜸’이라고 했다. ‘술’이란 말은 ‘수불’을 합한 글자이다. 곧 ‘수’에다 ‘불’자의 ‘ㄹ’를 가져와 ‘술’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설이다. 수는 물(水)이고, 불은 화(火)를 뜻하기 때문에 술에는 물과 불의 성질이 함께 들어있다. 술을 마시면 불처럼 길길이 날뛰는 자가 있는 반면, 술만 먹고 나면 신세타령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다. 그럴싸한 이야기다.
한자의 술 주(酒)는 본래 술동이를 뜻하는 주(酉)였다. 그래서 술과 관련한 글자에는 모두 주(酉)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 글자가 훗날 천간의 닭을 뜻하는 유(酉)가 되면서 술을 뜻하는 주(酒)자를 새로 만들어 쓰이게 된 것이다. 주(酒)는 항아리(酉)에 가득 담긴 술(氵)을 연상하게 하는 한자이다. 주(酒)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술을 마실 때는 급히 마시지 말고, 닭(酉)이 모이를 쪼아 먹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듯 3(氵)차례로 나눠 마시라는 위트가 엿보인다.
아주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담배는 피울지언정 술은 함부로 못 마시게 했다고 한다. 담배는 실수가 없지만, 술은 취하면 사람에 따라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처음 술을 잘못 배우면 술버릇이 고약해지는 예를 자주 본다. 그래서 술은 어른에게 배우라고 했고 종종 술자리에서 주도(酒道)를 논하기도 한다.
주법에는 자작(自酌)과 수작(酬酌), 그리고 대작(對酌)이 있다. 서양은 자기 술잔에 적당히 따라 마시는 자작 문화이고, 중국은 서로의 술잔을 마주쳐 건배하는 대작 문화이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가. 서로의 술잔을 주고받는 방식, ‘수작’이다. 수작은 술잔을 맞바꿔가며 돌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잔에다 술을 따라주는 것이다.
수작에서 수(酬)는 술을 내는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는 것을 말하고, 작(酌)은 답례로 손님이 주인에게 따르는 것을 말한다. 주인과 손님이 술을 권커니 자커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술자리를 ‘수작’이라 했다. 하지만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모사를 꾸미기 위한 술자리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수작질 한다’ ‘수작을 떤다’ ‘허튼 수작 부리지마!’ 등의 부정적 의미로 변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작금에는 보기 드문 현상이 되었지만, 한때는 마시던 술잔을 상대방에게 직접 건네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들어온 풍습으로 술이 아닌 술잔을 권하는 형태로 우리의 풍습과는 사뭇 다르다. 예부터 우리네는 순배(巡杯)잔과 자기 잔이 따로 있었다. 순배 잔은 계속 돌리고, 자기 술잔은 주량에 맞게 알아서 따라 마셨다.
경주의 포석정(鮑石亭)은 신라 때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순배 잔을 돌리며 곡수연(曲水宴)을 베풀던 풍류의 장소이다. 이때 포석정의 포(飽) 자는 복어(鰒魚)의 별칭이다. 복어 모양으로 구불구불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그 물길을 따라 술잔을 띄웠던 곳이 포석정이다. 술잔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다가 잠깐 멈추는 지점에 앉은 사람이 차례로 순배 잔을 받아 마셨던 것으로 유상곡수(流觴曲水) 놀이였다.
옛날 술잔은 대개 불투명한 그릇이라서 술을 따를 때는 잔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따라야 했다. 여기서 술 따를 짐(斟)자를 쓴 ‘짐작(斟酌)’이란 말이 나왔다. 또 술을 알맞게 따라준다 해서, 술 따를 작(酌)을 쓴 ‘참작(參酌)’, 일의 사정을 따져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작정(酌定)’, 돈이 없어서 노고의 대가로 술 한 잔 준다는 것을 보수(報酬)라 했으니 모두 술과 관련한 말이다.
간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은 숙취(宿醉)라고 한다. 숙취를 푼다고 해장국과 해장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 ‘해장’을 술에 찌든 장을 푼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본래 해장은 창자 장(腸)이 아닌, 숙취 정(酲)을 쓴 ‘해정(解酲)’으로 숙취를 푼다는 말에서 유래한다.
기쁜 일로 마시는 술은 ‘축배(祝杯)’, 쓰라린 일로 마시는 술은 ‘고배(苦杯)’, 독약이 든 술은 ‘독배(毒杯)’다. 혼자 마시는 ‘독작(獨酌)’, 곧 혼술족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일배일배부일배(一杯一杯復一杯)로 수작할 사람, 대작할 이가 없어지는 세상이 각박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옛날 제나라 위왕이 술에 도통한 순우곤에게 어떻게 마시는 술이 가장 맛있는 술인가를 물었다. 순우곤 왈 “벼슬에 9품이 있듯이 술에도 9품이 있나이다. 임금이나 상관들 앞에 부복해서 마시는 부복주(俯伏酒)가 제일 맛없는 9품, 공석에서 돌려 마시는 회음주(會飮酒)가 8품, 잔칫집서 낯선 자들과 마시는 예주(禮酒)가 7품, 술집서 여럿이 마시는 술이 6품, 친구 집에서 대작하는 것이 4품, 사랑방에서 혼자 마시는 술이 3품, 좋은 경치 찾아 대작하는 것이 2품, 풍광 찾아 독작하는 것이 1품이라 하옵니다.”
조선 중기 신용개는 달뜨는 밤이면 국화 화분 사이에 술상을 놓고 국화와 대작을 하는 호사를 누렸다. 또 명종 때 상진은 달빛 아래서 술을 마시는데 술잔 속에 달을 담아 그 달을 들이키는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좋은 친구나 아름다운 풍광을 벗 삼아 마시는 술이 최격(崔格)의 술이라는 말이다.
해는 저물고 한바탕 비가 쏟아질 기세다. 백거이의 시구 “能飮一杯無(능음일배무)”가 절로 생각나는 날이다.
세상살이 재미가 없다고 투덜대는 벗님네들! 나와 술 한 잔 하지 않겠는가.
조상열 발행인 ddmh21@hanmail.net